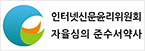독립 음악(Independent music·indie)을 뜻하는 ‘인디’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음반 제작부터 유통, 홍보까지 진행하는 뮤지션의 음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디 음악과 언더그라운드 또는 비주류 음악의 경계가 모호해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알고 보면 국내에는 사실상 인디 음악이 전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디라며 활동하지만 사실상 메이저의 ‘아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본래 인디와는 달리 음반 제작 방식이며 유통, 홍보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방법이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음원 시장의 유통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 CD시대 등 음반 시대를 지나 음원으로 대체되면서 대중들은 음원 공급 플랫폼에 가입해 스트리밍, 다운로드 형태로 음악을 감상한다. 소비자는 결제만 하면 원하는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공급 과정의 이면에는 다소 복잡한 유통 구조가 얽혀있다.
음원 공급 과정을 살펴보면 ‘음원 권리사’, ‘음원 유통사’, ‘음원 서비스업체’ 경로를 거쳐 제작자에서 소비자로 연결된다. 즉, 음원이 작곡자에서 리스너에게 도달하는 과정에 반드시 유통사가 붙는 구조다. 이런 음원 유통사의 주된 수입원은 중간 수수료기 때문에 ‘도매상’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그렇다면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음원을 발매할 수는 없을까. 현재 음원 시장 구조에서는 유통사를 배제한 가수·기획사와 음악 사이트 간 직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전문 유통업체는 기획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이용하는 멜론·지니 등 서비스플랫폼에 음원을 배급한다. 이 때문에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멜론, 벅스 등에 음원을 판매할 수가 없다. 물론 네이버 뮤직, 벅스 등이 ‘뮤지션리그’라는 섹션으로 기획사조차 없는 무명 인디 음악인의 음원 직거래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아직 보편화된 방식은 아니다.
이런 공급 구조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음원을 제작하는 인디 업계에는 치명타다. 메이저 유통업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 계약을 맺는 일이 드물다. 대부분 회사와 회사 간 계약으로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렇다 보니 무명 가수 개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형 유통사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소규모 기획사가 음원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소규모 전문 유통사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있다. 인디 성향 음악만 취급하는 중소 규모 유통업체는 이런 음악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편이다. 비록 가수 개인이 몸담은 소속사가 없더라도 음원을 이들 회사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대신 유통사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외에도 인디음악의 성공 케이스를 되짚어보면 참신한 유통 경로가 보인다. 25년차 펑크 록밴드 크라잉넛은 국내 인디밴드 1세대의 대표 주자다. 이들은 과거 ‘크라잉넛 카페’에서 공연하며 오프라인으로 노래를 알렸다. 카페 공간 자체를 열린 콘서트장으로 활용했다. 또 힙합 인디는 홍대 소재 ‘마스터플랜’ 클럽에서 태동했다. 또 홍대 ‘CLUB MWG(명월관)’에서는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유럽·미국 등 글로벌한 인디 음악이 흘러 나온다. 이와 함께 하우스 음악과 펑키 록, 디제잉이 더해진 일렉트로닉 인디 음악을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처럼 일반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알리려는 인디 음악계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참신한 음악이 주무기인 만큼 유통과 공급 과정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다.